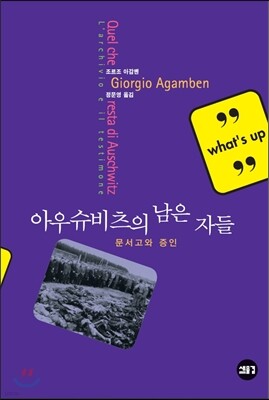2013. 11. 4.
2013. 9. 1.
미셸 푸코의 생명관리정치
미셸 푸코의 생명관리정치
1. 푸코와 권력의 문제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1926-1984)는 대략 1970년을 전후로 이전의 이른바 자신의 ‘구조주의적’ 혹은 광의의 언어학적 시기를 마감하고, 니체적 의미로 이해되어야만 하는 ‘권력의 시기’로 접어든다. 물론 푸코 스스로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은 구조주의자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과연 그 이전 시기의 푸코가 과연 구조주의자였는가의 여부는 이 자리에서 다루지 않기로 한다. 여하튼 푸코는 1970년을 전후로 변화 혹은 변혁의 이유와 동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공시적인 혹은 이른바 ‘정태적인’ 구조주의적 함축을 지양하고, 권력의 문제에 집중한다. 푸코의 권력에 대한 이러한 천착은 대략 1970년 말을 기점으로 하여 시작되는 이후의 이른바 ‘주체 혹은 윤리의 시기’가 시작되는 1980년의 인터뷰에서조차 스스로 “근본적으로 나는 오직 권력의 역사만을 다루었을 뿐입니다.”라는 발언을 가능케 할 만큼 푸코 사유의 근본적 지향점들 중 하나였다. 푸코는 1976년 언어학으로부터 권력에로의 이러한 전환을 ‘의미 관계들이 아니라, 권력 관계들’(Relations de pouvoir, non relations de sens)이라는 말로써 정리한 바 있다. 물론 이 권력의 시기를 대표하는 동시에 그의 대표적인 주저로 보아야만 할 1975년의 『감시와 처벌. 감옥의 탄생』(Surveiller et punir. La naissance de la prison)이 바로 그러한 것처럼, 권력의 문제는 푸코의 사상 중 가장 독창적인 동시에 논쟁적인 주제임에 틀림없다. 이 시기 푸코 권력관은 단적으로 1970년대 초 이래 푸코가 사용하기 시작하는 권력-지식(le pouvoir-savoir) 및 그 기초로서의 권력 관계들(les relations de pouvoir)이라는 용어로서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속하는 푸코의 이른바 생명정치(le bio-pouvoir) 개념은 바로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2. 전통적 권력관(觀) 비판
푸코는『감시와 처벌』을 통해 권력에 대한 기존의 관념을 뒤엎는다. 이 때 푸코가 말하는 권력의 ‘기존’ 관념들이란 단적으로 플라톤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정치사상이라는 세 가지 권력관을 일컫는다. 우선 플라톤주의는 진리와 권력의 관계를 대립적인 것으로 본다. 곧 권력은 본성적으로 권력이 진리를 굴복시키려하는 억압적 측면을 가지고 있고, 진리는 그것에 굴종, 중립, 거부 혹은 초연하는 등의 다양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물론 플라톤의 ‘해답’은 진리를 이해하는 자들이 정치적 권력을 쥐어야만 한다는 이른바 철인정치론이다. 플라톤의 이상국가론은 단적으로 지배계급이 어떻게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진리에 복종할 수 있는가를 다룬 이론이다. 다음으로 근대의 자유주의적 권력관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초적 배경 위에 상행위 및 시민적 자유를 첨가한다. 물론 이에는 사목적 권력(le pouvoir pastoral) 및 공안(公安, la police)의 개념을 포함한 다양한 근대의 통치 기술들이 포함된다. 이에 더하여 역사적으로 가장 늦었지만 당시 1970년대의 유럽, 좁게는 프랑스 사회 안에 사는 푸코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권력관은 물론 사회주의의 권력관이다. 사회주의적 권력관 역시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위험한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관계로 본다. 곧 사회주의의 권력관은 단적으로 그것이 표방하는 ‘진리-이데올로기’ 사이 대립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진리는 과학성을 담보한 세계에 대한 올바른 반영으로서의 인식이며, 그것이 계급적 이해관계 곧 허위의식에 의해 가려진 것이 이데올로기이다.
물론 푸코는 이러한 세 가지 기존 관념들을 모두 논파하고자 하지만, 우선 스스로 이 모든 것의 중핵에 위치한다고 보는 플라톤주의의 권력관을 공격한다. 1973년 푸코는 브라질의 한 세미나에서 발표한 일련의 논문들을 모은 「진리와 사법적 형식들」(La vérité et les formes juridiques)을 통해 플라톤주의의 진리-권력관을 비판하며 자신의 권력-지식론의 단초를 내비친다. “[플라톤 이래] 서양은 진리가 결코 정치적 권력에 속하지 않으며, 정치적 권력은 눈먼 것이라는 거대한 신화에 의해 지배되게 된다. [...] 플라톤과 함께 서양의 거대한 신화 하나가 시작되는데, 지식과 권력 사이에는 이율배반이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만약 지식이 있다면, 그것은 권력을 포기해야만 한다. 지식과 학문이 자신의 순수한 진리를 찾는 곳에는 더 이상 정치적 권력이 존재할 수 없다. / 이 거대한 신화는 이제 청산되어야 한다. 모든 지식, 모든 인식의 뒤에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의 권력 투쟁이라는 점을 보임으로써 니체가 파괴하기 시작했던 것이 바로 이 신화이다. 정치적 권력은 지식의 결여가 아니며, 지식과 함께 짜여 지는 것이다.”
이제 푸코는 플라톤주의의 권력관을 근원적으로 부정하고 두 가지 근대적 권력관으로서의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권력관을 고찰한다. 한편 푸코에 따르면, ‘우리 시대’에 이렇게 권력의 문제가 전면에 부각된 것은 ‘우리의’ 현실이자 과거인 파시즘과 스탈린주의의 존재이다. 푸코는 이들을 20세기 권력의 두 가지 커다란 질병 혹은 두 가지 병리학적 형태라 부른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20세기 권력의 두 가지 커다란 질병이 칸트로부터 시작되는 주된 철학적 자원들 중 하나로부터 기원하는 ‘우리 정치적 합리성’의 관념 및 절차를 이용해 왔다는 점이다. “칸트 이래로, 철학의 역할은 이성으로 하여금 경험 내에 주어진 것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후, 즉 근대 국가 및 사회의 정치적 관리의 발전 이후, 철학은 또한 정치적 합리성의 과잉 권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따라서, 푸코에 따르면, 이 ‘질병들’ 아래에 놓여있는 것은 합리성 혹은 정치적 합리성 자체의 문제이다. 이 ‘질병들’은 칸트 이래의 국가 이론 내에 존재하는 근대적 정치적 합리성에 관련된다는 의미에서 고유하게 근대적인 문제들이다. 따라서 확립되어야 할 것은 근대 정치적 합리성의 기제를 분석할 수 있는 권력 관계의 새로운 경제이다. 오늘날 권력은 다름 아닌 합리성 곧 진리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푸코에 따르면, 이러한 ‘질병들’에 관련된 오늘날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다름 아닌 적절한 분석 도구의 결여이다. 권력에 고유한 관계 양식을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분석의 도구를 발견하기 위한 첫 작업으로서 푸코는 기존의 권력 개념들에 대한 탐구를 시작한다. 아래에서 나는 푸코의 이러한 탐구를 사법적 유형, 선험적 주체의 유형, 이데올로기적 유형, 경제적 유형 및 총체성의 유형이라는 다섯 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구분을 통하여 푸코는 기존의 플라톤주의ㆍ자유주의ㆍ사회주의의 권력관 일반을 관통하는 지점들을 포착ㆍ비판한다.
1) 첫째, 권력에 대한 사법적(juridique ou juriste) 관념이 있다. 이러한 관념은 권력을 순수히 그리고 배타적으로 부정적이며 억압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사법적 권력은 “권력의 시니피에, 중심점, 권력을 구성시키는 핵심을 여전히 금지, 법률, 안 된다고 말한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한 번 “너는 해서는 안 된다”(tu ne dois pas)는 형식, 공식에 둔다.” 권력 심급의 이러한 금지 법률에로의, 혹은 “주인 형상”에로의 환원은 다시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갖는다. 이 환원은 권력이 가족, 국가 및 교육·생산 관계 등 우리가 위치해 있는 몇몇 수준들에 동질적이라는 권력 도식을 유효한 것으로 만든다. 그 결과로 권력은 순수히 배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서 인식된다. 억압, 거부, 한정, 장벽, 검열, 금지. 간단히 말해, 이러한 환원 안에서 권력은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법에로의 환원”은 “권력의 근본적 작용을 법의 언표, 금지의 담론 등과 같은 하나의 발화 행위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권력의 행사는 ‘너는 해서는 안 된다’는 순수한 형식을 꿈꾼다.” 권력의 사법적 관념은 권력의 순수히 부정적 관념인 억압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푸코에 따르면, 권력에 대한 억압적 관념은 권력의 긍정적 측면을 포착하게에는 전적으로 부족하며 불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권력을 “억압을 그 기능으로 하는 하나의 부정적 심급”으로서보다는 “모든 사회적 신체를 가로지르는 하나의 생산적 그물망”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틀을 찾아내야만 한다.
더욱이 권력의 사법적 관념 안에는 항상 군주(souverain)와 신민(sujet)이라는 두 개의 주체가 존재한다. 사법적 권력 모델의 본질적 질문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권력을 합법화 시켜주는 것은 무엇인가?” 권력에 대한 사법적 관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법이라는 수단을 통한 권력의 합법화ㆍ정당화ㆍ합리화의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법의 형식은 하나의 권력 표상 체계이다. 따라서 푸코에 따르면 권력을 금지의 심급으로 만듦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이중적 주체화를 행하게 된다. “그것이 수행되는 측면에서, 권력은 마치 아버지, 군주, 일반의지의 절대권(souveraineté)처럼 금지를 말하는 일종의 - 현실적, 상상적 혹은 여하튼 순수하게 사법적인 - 절대적 주체로서 이해된다. 권력에 복종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금지의 승인이 이루어지는 지점, 우리가 권력에 대해 ‘예’ 혹은 ‘아니오’라 말하는 지점을 결정함으로써 권력을 ‘주체화’(subjectiviser)하게 된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절대권의 수행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자연법의 포기, 혹은 사회 계약, 혹은 주인의 사랑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법적 권력 개념에서 관계의 두 당사자인 군주와 신민은 각기 하나의 선험적 주체 혹은 실체로서 이해되어 있다. 이를 푸코는 다음처럼 요약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권, 즉 법, 금지의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되지 않은 정치 철학입니다. 왕의 머리를 잘라야 하며, 우리는 아직 정치학 이론에서 이 일을 수행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 푸코에 따르면, 부르주아의 흥기 이후, “서양은 사법적 체계, 법적 형식이외의 어떤 권력 분석·형성·표상의 체계도 갖지 못했다.” 한편 부르주아지야말로 근대의 대표적 계급이라는 점에서 권력의 사법적 형식은 근대에 고유한 권력 형식이자, 이 시기의 대표적 권력 형식이다.
2) 이러한 사법적 권력 개념으로부터 권력에 대한 두 번째 전통적 형식이 탄생한다. 이는 선험적 주체의 관념에 기반한 권력 형식이다. 이는 고전 철학의 전통적 주체 개념을 전제하는 것으로 오늘날에는 현상학과 실존주의에 의해 대표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이론들에서 우리는, 주체의 요청으로부터 출발하여, 어떤 형식의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물을 수 있다. 푸코는 실체로서의 주체로서 간주되는 개인을 전제하는 이런 선험적 주체의 아 프리오리한 이론을 거부한다. 그런데 이 개인은, 그것에 대해 권력이 행사되고 달려드는 어떤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특성, 정체성, 자기에로 향하는 주형작업과 함께 신체, 복수성, 운동, 욕망, 힘들 위로 행사되는 권력 관계의 생산물”이다. 푸코에게 있어서의 주체는 단지 복수적이며 복합적인 권력 관계들에 의해 구성된 하나의 효과, 생산물에 불과하다. 간단히 말해, 권력에 유용한 혹은 저항하는 하나의 지식을 생산하는 것은 인식 주체의 행위가 아니다. 주체는 하나의 목표에 관련되어 스스로를 구성한다. 더욱이 주체-지식-대상(sujet-connaissance-objet)의 삼중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작용은 본질적으로 상호적 과정이다. “인식하는 주체, 인식되어야 할 대상 및 인식의 양태들 역시 권력-지식 및 그것의 역사적 변형이라는 이 근본적 함축의 효과들이다.” 우리는 따라서 자유롭거나 혹은 그렇지 않은 하나의 주체로부터 권력을 분석할 수 없다. 푸코에 따르면, 우리는 인식 및 주체의 우위라는 관념에 기초한 권력의 옛 개념을 포기해야만 한다.
3) 권력에 대한 세 번째 전통적 견해는 이른바 진리와 이데올로기 사이의 대립에 기초해 있다. 물론 이러한 관념은 마르크스주의의 주된 주장들 중 하나이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푸코는 마르크스주의가 반성되지 않은 근대적 곧 19세기적 국가 철학의 관념을 담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이데올로기”를 분석하는 마르크스주의의 방법론은, “순진하게도”, “고전 철학을 모델로 삼고 있으며 권력이 탈취하고자 하는 의식을 부여받은” 하나의 인간 주체를 전제하고 있다. 1976년의 한 대담에서 푸코는 이데올로기 개념과 관련된 난점들을 다음처럼 세 가지로 정리한다. “나에게 이데올로기라는 관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로 사용하기 곤란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 관념이 이른바 진리라는 어떤 것과의 잠재적인 대립 상태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제 생각에 문제는 하나의 담론 안에서 과학성, 진리에 속하는 것과 다른 것 사이의 구분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자체로는 옳지도 그르지도 않은 하나의 담론 내부에서 진리 효과가 생산되었는가를 보는 것이다. 두 번째 적절치 못한 점은 그것이 내 생각에는 필연적으로 주체와 같은 무엇인가를 지칭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물질적 결정요소 혹은 하부구조로서 기능하는 무엇인가에 대해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이른바 진리-이데올로기의 대립 쌍은 푸코에 의해 ‘현재의’ 정치 현상을 분석하기에 무능력한 것, 부적절한 것으로 판정된다. 진정한 정치적 질문의 대상은 이데올로기, 소외된 의식, 환상, 오류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합리성과 진리 그 자체이다. 이렇게 해서, 지식인에 있어서의 정치적 문제는 더 이상 “과학에 연관되어 있는 이데올로기적 내용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진리의 정치학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알아내는” 것이며, “진리 생산의 제도적, 경제적, 정치적 체제를 분석하는” 것이다.
4) 권력에 대한 네 번째 전통적 관념은 경제주의(l'économisme)이다. 1976년의 콜레주 드 프랑스 강의에서 푸코는 “정치적 권력의 사법적 및 자유주의적 개념, 즉 18세기 사상가들에게서 우리가 발견하는 개념,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적 개념 혹은 여하튼 마르크스주의적 개념이라 할 만한 현재의 일정한 개념 사이의 일정한 공통점”에 대해 언급한다. 경제주의는 자유주의 및 마르크스주의 권력 개념의 공통요소이다. 18세기 혹은 보다 정확히는 계몽에 대한 언급을 통해 푸코는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 양자가 모두 근대 계몽주의 경제사상의 아들들임을 명확히 한다. 이런 의미에서 경제주의는 근대 권력 이론의 대표적 양식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제주의는 역사적으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우선 자유주의적 경제주의는 근본적으로 권력에 대한 사법적이며 계약론적인(contractuelle)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주의에서 권력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소유물, 재산으로 간주된다. “권력에 대한 고전주의의 사법적 개념에서 권력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 소유 가능한 하나의 재산, 그리하여 우리가 계약 혹은 양도 명령에 해당하는 어떤 사법적 행위 혹은 입법 행위에 의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이전되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어떤 것으로서 간주된다. 권력은 구체적인 것, 모든 개인이 하나의 정치적 주권을 구성하기 위해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보유하거나 양도할 수 있는 무엇이다. 따라서 이 모든 이론 전체에 걸쳐 드러나고 통용되는 권력과 재산, 권력과 부(富) 사이에 존재하는 하나의 유비가 있다.” 하나의 소유하거나 박탈당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재산으로서의 권력. 경제주의는 본질적으로 계약 및 교환의 질서라는 사법적 작동의 모델 위에 기초해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정치권력은 근본적으로 교환 및 재산·재화 순환의 경제학 안에서 자신의 전범을 발견하게 된다.
다음으로 마르크스주의적 경제주의가 있다. 마르크스주의적 경제주의는 푸코가 권력의 경제적 기능 작용이라 부르는 것 안에 속하는데, 이는 “생산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력 전유의 발전 및 고유한 양식을 가능케 하는 계급 지배를 연장시키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 개념이다. 정치권력은 경제 안에서 자신의 구체적 형식 및 현재적 기능의 원칙 그리고 자신의 역사적 존재이유를 발견한다. 간단히 말해, 마르크스주의에는 상부구조로서 간주되는 정치권력에 대한 하부구조로서의 경제의 우위가 존재한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의 권력 개념 양자에는 공히 일종의 경제주의 혹은 경제적 환원주의가 존재한다.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막론하고, 이 경제적 환원주의를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의 다음의 것이다. “권력 분석은, 어떤 방식으로든, 항상 경제로부터 추론되어야 하는가?” 이에 대한 푸코의 대답은 물론 부정적이다. 푸코는 경제주의와 연관된 제 문제점을 일련의 질문들로 요약한다. “첫째, 권력은 경제에 비해 언제나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하는가? 권력은 본질적으로 그 목적과 존재 이유에 있어 경제에 봉사해야 하는가? 권력은 경제를 움직이게 하고 이 경제에 특징적이며 그 기능에 본질적인 관계들을 견고하게 만들고 유지시키며 연장하도록 운명지어져 있는가? 두 번째 질문 : 권력은 상품의 모델을 따라 형성되어야 하는가? 권력은 소유되고 획득되며 계약 혹은 힘에 의해 양도되고 포기되며 회수되고 순환되며, 어떤 지역에는 공급되고 또 어떤 곳에는 회피되어야 하는 어떤 것인가? 혹은 비록 권력 관계들이 경제적 관계들 안에서 혹은 그러한 관계들과 함께 깊이 연결되어 있다 해도, 또 비록 사실상 권력 관계들이 언제나 경제 관계들과 함께 일종의 결합 혹은 고리를 구성한다 해도, 이 경우, 경제와 정치적인 것 사이의 분리 불가능성은, 기능적인 종속의 질서 혹은 형식적 동형성의 질서가 아니라, 정확히 서로 분리되어야만 할 또 다른 하나의 질서가 아닐까?”
요약하면, 권력의 ‘권력 아닌 것’, 즉 이 경우에는 ‘경제’로부터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이는 결국 권력의 비(非) 경제중심주의적 분석의 가능성을 묻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에 기초하지 않은 권력의 새로운 관념을 수립하는 것이 문제이다. 이는 푸코에게 있어 니체에 의해 처음으로 설정되었던 새로운 권력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권력 분석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러한 방법론 안에서 권력의 형성 및 구성, 기능, 이른바 권력의 ‘본성’은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설정될 것이다.
5) 권력에 대한 다섯 번째 전통적 관념은 권력에 대한 총체성(la totalité) 혹은 총체화(la totalisation)의 관념이다. 권력에 대한 이러한 유형의 고찰은 언제나 전체주의적 이론에 고유한 억제 효과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된다. 즉 이러한 이론들에서 권력은 언제나 포괄하며 포섭하는 것으로서 바라본다. 예를 들어, 정신분석 및 마르크스주의는 집중화하는 동시에 그 자체로 집중화되어 있는 이론들이다. 스스로를 권력 이론의 전위로서 선언하는 이러한 총체성의 담론들은 언제나 한편으로는 모든 권력 관계에 선행하며 하나의 주어진 실체로서 이해되는 아 프리오리한 주체 혹은 개인을, 또 한편으로는 억압을 그 본질로 하는 또 하나의 절대적 실체로서의 국가 기구(appareil d'Etat)를 전제한다. 이렇게 해서 총체성의 담론은 자신의 분석을 사실상 권력의 거시적(macro) 즉 국가적 차원에로 한정한다. 이를 푸코는 정치 분석에 있어서의 국가 기구의 우위라 부르는데, 이러한 우위 혹은 한정의 결과는 본질적으로 하나의 사법적 상부구조로서 이해되는 권력의 보존과 재생산이다. 따라서 이러한 총체화 담론은 권력의 미시적 수준, 즉 “일련의 점점 더 미묘해지는 미시적 권력들”로서의 미시 권력(le micro-pouvoir) 혹은 하부 권력(le sous-pouvoir)을 구분해 낼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드러낸다. 그리고 푸코가, 들뢰즈의 표현처럼, “우리가 ‘미시적’이라는 말을 가시적인 혹은 언표 가능한 힘들의 단순한 미니어처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또 다른 영역, 하나의 새로운 관계 유형, 지식에로 환원할 수 없는 사유의 차원”, 즉 “항상 움직이고 있으며 고정시킬 수 없는 관계들”로서 이해한다는 조건 하에, 권력이 하나의 미시물리학으로 되돌아간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그리고 이 권력의 미시물리학(la microphysique du pouvoir) 안에 “부차적인 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전통적 마르크스주의 분석은 권력의 국지적(locale)이고 지역적(régionale)이며 특수한(spécifique) 분석 위에 새로이 기초 지어져야 한다.
그러나 다시 한 번 권력에 대한 푸코의 이러한 미시 분석이 그것의 거시적 차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권력의 미시물리학은 권력의 거시적 측면을 미시 권력의 ‘보다 가시적이지만, 사실상은 더 부차적인’ 하나의 파생적 측면으로서 바라본다. “국가는 그것의 사법적, 군사적 및 여타의 거대 기구들과 함께 오직 주된 길과는 다른 운하를 통과하는 권력의 모든 그물망에 대한 뼈대, 보증을 표상할 뿐이다. [...] [국가는] 물론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지만, 우월한 지위를 갖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국가적 단위는 근본적으로는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이 지역적이고 특수한 권력들에 대해 부차적”이다. 간단히 말해, 푸코는 “국가가 전혀 다른 차원 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권력의 미시물리학을 구성하는 무수한 톱니바퀴 및 초점들에 의해 생겨나는 어떤 다수성의 결과 혹은 하나의 전체적 효과처럼” 보이게 되는 새로운 그림을 우리 앞에 펼쳐 놓는다. 마치 물리학 이론에서 상대성 이론이 전통적인 뉴턴 물리학의 모든 측면을 하나의 특수한 경우로서 포괄하는 것처럼, 미시 권력 역시 거시 권력의 모든 측면들을 자신의 특수한 하나의 경우로서 포괄한다. 우리는 이를 거시 권력에 대한 미시 권력의 우위라 불러볼 수 있을 것이다. 푸코는 이 미시 권력의 관점을 권력 관계들에 기초한 권력-지식이라는 새로운 권력의 작용 체계에 대한 정합적이고도 완전한 설명을 1975년의 『감시와 처벌』에서 제시한다.
3. 권력 관계들, 권력-지식
푸코의 주된 철학적 기획들 중 하나는 주체·대상·인식·신체·영혼·지식·국가 등 전통적으로 실체(substance)로서 간주되었던 일련의 사물 혹은 현상들을 문제화하는 것이다. 『감시와 처벌』과 관련하여 이제 푸코가 문제 삼는 것은 ‘전통적인’ 실체로서의 권력 개념이다. 권력은 역사적으로 생성되고 구성된 것으로 간주되어야만 하는데, 이는 권력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립시켜줄 새로운 유형의 권력 분석 작업에로 귀결된다. 실체가 아닌 이 새로운 권력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며 다른 요소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절대적이거나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국지적·지역적·관계적이고, 유일성이 아닌 다수성ㆍ복수성을 그 성질로 가지며, 동질적이지 않고 이질적이다. 푸코는 이러한 비실체적이며 언제나 다수적·복수적인 권력을 권력 관계들(les relations ou rapports de pouvoir) 혹은 힘 관계들(les rapports de forces)이라 부른다. 아래에서는 이 권력 관계(들)의 몇 가지 특징들을 알아보자.
1) 우선, 권력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며, 차라리 하나의 관계 혹은 일련의 관계들이다. 푸코는 자신의 새로운 권력론의 철학적 기초를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권력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다.” 따라서 대문자로 시작되는 이른바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권력, “그것은 행사되는 것이며, [...] 오직 행위 안에서만 존재한다.” 권력 혹은 권력 관계는 “다른 것들에 대해 직접적 혹은 즉각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작용하는 하나의 행동 양식”(un mode d'action qui n'agit pas directement et immédiatement sur les autres, mais qui agit sur leur action propre) 혹은 “행동에 대한, 실제적 또는 현실적인, 미래의, 현재의 행동들에 대한 하나의 행동”(une action sur l'action, sur des actions éventuelles, ou actuelles, futures ou présentes)으로 간주되어야만 한다.
2) 따라서 권력은 단수로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다수·복수의 형태로만 존재한다. 따라서 주어진 특정 시간, 특정 공간 내에 존재하는 각각의 권력은 자신만의 특수한 규칙들을 갖는다. 간단히 말해, “어떻게 그것[권력]이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탄생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사회가 상이한 권력들이 이루어내는 하나의 군도(群島)인 한, “권력들에 대해 말하고자” 그리고 “그것들[권력들]을 각자의 역사적 지역적 특수성 안에서 국지화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3) 권력의 이러한 복수적ㆍ다수적인 동시에 특수하고 지역적인 특성은 권력의 이질성( l'hétérogénéité)이라는 권력 관계의 또 다른 특성을 드러낸다. 전통적 권력 개념 안에서 권력은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어떤 것, 즉 거시권력으로서의 국가적인 것,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해되었다. 권력 관계 안에는 다만 다양한 수준의, 혹은 무한한 수의, 이질적이고 상이한 미시권력들, 작은 권력들만이 존재할 뿐이다. 권력 관계들은 서로서로에 대해 이질적이다. 따라서,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의 경제적 심급과 같은, 어떤 유일한 최종적 심급에로 환원될 수 없는 다양한 이질적 장들의 집합이 존재한다.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입장에서 감옥, 광기, 안전, 보건, 위생, 성, 의학, 인구 등의 생명 정치적 테크놀로지들은 문제의 ‘본질적인’ 부분에 속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러한 것들의 존재 혹은 중요성이 마르크스주의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다. 물론 이것이 푸코 이론이 오늘날 그토록 ‘각광받는’(?) 이유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권력에 대한 하향적이 아닌 상향적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들뢰즈가 권력이란 “오직 자기 회랑의 망, 다수의 자기 땅굴만을 알아보는 두더지”이며, 이 두더지는 ”무수한 지점으로부터 움직이면서”, “밑으로부터 온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이다.
4) 권력 관계들은 소유물이 아니라 효과이다. “이 권력은 소유된다기보다는 행사되는(s'exerce) 것이라는 것, 그것이 지배 계급에 의해 획득 혹은 보존되는 ‘특권’이 아니라, 그 전략적 위치들의 집합이 갖는 효과(l'effet d'ensemble de ses positions stratégiques), 지배받는 자들의 위치에 의해 드러나며 때로 동반되는 효과임을 인정해야만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전통적 의미의 ‘권력’이 사실은 언제나 권력-지식의 효과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효과로서의 권력은 전통적 개념 안에서 권력의 행위자 혹은 후견인 또는 보증인의 역할을 수행했던 실체적 혹은 선험적 주체, 혹은 개인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 및 권력과 마찬가지로, 개인 역시 실체가 아니며, 다만 그것을 생산하는 권력 관계의 가시적인 그러나 부차적인 하나의 효과일 따름이다. 이제 권력에 대한 전통적 삼위일체-, 권력을 행사하고 권력 행사의 대상이 되는 개인, 실체로서의 권력, 권력이 행사되는 장소로서의 국가-는 파괴되고, 개인화(정상화)-권력 관계들-국가화(l'individualisation(normalisation)-des relations de pouvoir-l'étatisation)라는 새로운 관계가 탄생한다. 이러한 ‘전략적 위치들의 집합이 발생시키는 효과’로서의 권력 관계에 대한 빼어난 사례는 벤담(J. Bentham, 1748-1832)이 고안한 판옵티콘(le panoptique)이다. 판옵티콘 혹은 일망감시체제(一望監視體制)에서, 우위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은 다름 아닌 요소들의 위치들 혹은 배치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 판옵티콘 안에는 어떤 절대적 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권력이 “언제나 이미 그곳에”(toujours déjà là)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결코 “바깥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5) 이러한 절대적 지점의 부재로부터 주어진 권력 관계들 안에서의 전략적·전술적 위치들로 구성되는 하나의 위상학이 탄생한다. “권력 관계들”이란 표현은 사실상 “우리가 언제나 서로서로에 대해 전략적인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푸코는 이런 의미에서 전략을 “권력 관계들 안에서 작동하는 기제들”이라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략에는 소유자 혹은 행위자가 없으며, 각각의 우선적 목적들이 갖는 상이한 효과 및 그 효과의 유용성으로부터 탄생하는 일정한 수의 전략들이 존재할 뿐이다. 서로서로를 구성하고 작동시키며 변형시키는 것은 언제나 주어진 특수한 상황 내에서의 전략적 배치들이다.
4. 생명관리정치와 내치
규율적 권력은 “외부를 갖지 않는다.” 그것은 규범화 혹은 정상화하는 권력이며, 전방위적인 규율적 사회 관리 체계이다. 정상화(normalisation)란 단적으로 푸코가 말하는 권력 테크놀로지의 모든 부정적 효과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말로서, 규범화ㆍ규격화ㆍ표준화ㆍ획일화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된다. 우리 사회에서, “규범성 혹은 정상성의 심판관은 [...] 모든 곳에 존재한다. 우리는 교수-심판관, 의사-심판관, 교육자-심판관, ‘사회 노동자-심판관’, 이들 모두는 규범적인 것 혹은 정상적인 것의 보편적 지배를 가능케 한다. 그리고 각자는 자신의 신체, 태도, 행위, 행동 양식, 재능, 성과를 이에 복종시키는 지점에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감시받고 처벌하며, 감시하고 처벌한다. 누가 누구를? 우리가 우리를.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이렇게 규율적인 동시에 공안적인 일망감시적 근대사회는 타인과 자신을 ‘정상화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슬로건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모두가 서로서로 닮도록 하라.” 그리고 이러한 근대적 정상화의 테크놀로지는 역사 속에서 근대 자유주의(liébralisme) 및 푸코가 말하는 생명 정치의 관념과 복잡하게 얽혀 있다. 우선 푸코는 생명 정치를 다음처럼 정의한다. “건강, 위생, 출생, 장수, 인종 등과 같이 18세기 이래 우리가 인구(population) 안에서 구성되는 생명체들 전체에 고유한 현상들에 의해 나타나는 통치적 실천에 의해 제기되는 문제들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식들.” 이는 다시 16-17세기 이래 유럽에 나타난 통치 기술로서 ‘한 영토 안에 존재하는 인구 전체의 복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려는 내치(內治, 公安, la police)의 관념에 밀접하게 연결된다. 이 la police라는 용어는 오늘날 일어로서 우리가 이해하는 경찰 혹은 그러한 제도라는 관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인구의 총체적 복지’를 책임지는 내치학(Polizeiwissenschaft)은 결혼ㆍ출산ㆍ생존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의학적ㆍ행정적 국가적 관리 시스템의 탄생을 가져온다. 정신의학과 우생학이라는 기획은 19세기 후반 이 분야의 두 가지 중요한 혁신이다. 이것이 푸코가 말하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이래 서양을 지배해온 생명 권력의 실체이다. 생명 권력이란 이렇게 18세기 말 이래 유럽에서 발달한 자신의 영토 안에 속하는 모든 인민을 대상으로 하여 그 인구, 생명, 건강, 안전을 총괄 관리하는 국가 관리 시스템, 곧 공안 정책을 일컫는다. 이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현대의 복지 국가의 이론적 시초이며, 동시에 부정적으로 국가에 의한 인민의 전면적 관리 통제 사회의 시초로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푸코의 생명 권력에 대한 이해는 권력-지식론에 입각한 것으로 그 부정적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 권력은 생명에 대한 곧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le pouvoir sur la vie)이다.
5. 생명 권력 - 죽음의 권리와 생명에 대한 권력
푸코에 따르면, 군주권의 특징은 서양에서 오랫동안 생명과 죽음의 권리(droit de vie et de mort)이며, 이는 사실상 “죽게 만들거나, 살도록 내버려두는 권리”(droit de faire mourir ou de laisser vivre)이다. 이는 ‘칼’로써 상징되는 권리로서, 이때의 권력은 주로 징수의 수단, 갈취의 기제, 일부분의 부를 전유할 권리, 피지배자들로부터 생산물, 재산, 봉사, 노동, 그들의 피를 강제로 빼앗는 역사적 관행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권력은 무엇보다도 물건, 시간, 육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권리로서 특히 생명을 빼앗는 행위에서 그 절정에 달하는 권리이다. 그러나 고전주의 시대 이후, 징수는 더 이상 권력의 주된 기제가 아니며 다만 피지배자들에 대한 선동, 강화, 통제, 감시 그리고 그들의 생명 및 물자의 최대한의 활용 및 조직화 기능을 하는 여러 요소들 중 하나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시 말해 고전주의 시기 이후 서양에서는 여러 세력들을 가로막고 축소시키고 파괴하는 것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것들을 낳고 키우며 조직하는데 더 몰두하는 새로운 유형의 권력이 탄생한 것이다. 이제 강조점은 죽음의 권리에서 생명을 관리하는 권력의 요청에 상응하는 혹은 적어도 상응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권리에로 이동한다. 죽음의 권리는 이제 “생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행사되는 권력, 다시 말해 생명을 관리하고 최대한으로 생명을 이용하여 확장하고, 생명에 대한 정확한 통제와 전체적 조절을 행사하고자 하는 권력” 곧 생명 (관리ㆍ통제) 권력, 곧 생명과 생존, 육체와 종족의 관리자로서의 권력의 한갓 보조물로서 이해된다. 이러한 논리 아래에서는 사형제도조차 어떤 인권 의식의 발로라기보다는, 차라리 죄인의 잔악성, 교정 불가능성 그리고 사회의 안녕과 안전을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선택으로서 이해된다. ‘죽게 만들던가 살게 내버려두는’ 이전의 권력은 이제 개인을 ‘살게 만들던가 죽음 속으로 추방하는’ 권력(un pouvoir de laisser vivre ou de rejeter dans la mort)이 된다. 마찬가지 논리에 의해, 자살조차도 근본적으로 군주와 그를 보증하는 신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이전 시대의 논리를 뚫고 생명에 행사되는 권력의 경계와 틈새를 비집고 나타난 개인적이고 사적인 권리의 일부로서 이해된다. 사형제도와 자살은 이처럼 근대 생명 권력이 가능케 했던 하나의 사회적이고도 정치적인 현상이다.
푸코에 따르면 17세기 이래 두 가지 주요한 형식으로 전개되어 왔는데, 하나는 기계로서의 육체에 관심을 두는 것으로서 이는 “육체의 조련, 육체적 특성에 대한 최대한의 활용, 체력의 착취, 육체의 유용성과 순응성의 동시적 증대, 육체의 효률적이고도 경제적인 통제 체제로의 통합 및 이 모든 것의 규율을 특징짓는 권력의 절차” 곧 인체의 해부정치학(anatomo-politique du corps humain)이며, 또 다른 하나는 종(種)-육체(le corps-espèce) 곧 생명의 역학이 스며들고 생물학적 과정의 전반을 통해 주축의 역할을 하는 육체를 중심으로 하는 인구의 생명 정치학이다. 이러한 육체의 규율과 인구의 조절, 혹은 육체의 조절과 생명의 계산적 통제라는 양대 원리는 서로서로를 형성하며 서로에 대해 상보적인 두 형식으로 생명 권력, 생명 정치학, 해부 정치학 및 생명 정치학(anatomo-politique et bio-politique)의 탄생을 가능케 한 두 결정적 요소들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실상 성의 역사 혹은 섹슈얼리티의 역사는 하나의 생명 역사(bio-histoire) 곧 생명을 관리하고 통제해온 담론의 역사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이러한 생명 역사 혹은 생명 권력은 정상화라는 하나의 중심을 돈다. “정상화하는 사회는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특정한 권력 테크놀로지의 역사적 효과이다.” 정상화 과정에서 정치적 쟁점으로서의 성이 갖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본질적으로 정상화하는 권력’이라는 배경 곧 생명을 중심으로 한 육체에 대한 미시권력(micro-pouvoir sur le corps)이라는 관점 아래에서이다.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육체와 인구의 접합 지점에서 성(le sexe)은 죽음의 위협보다는 오히려 생명의 관리를 둘러싸고 조직되는 권력의 중심점이 된다.” 이처럼 성은 18세기에 들어 공안의 대상이 된다. 이러한 성의 공안(police du sexe)으로부터 ‘금지의 엄격함이 아니라 유용하고 공적인 담론에 의해 성을 규제할 필요’가 나타난다. 이러한 기본적 관심에 의해 이제 인구가 당대의 중요한 정치경제적 문제로서 부각되며, “인구라는 이러한 경제적 정치적 문제의 핵심에는 성이 있다.”
6. 욕망의 억압에서 쾌락의 활용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이러한 생명정치의 조절 메커니즘 속에서 무력하게 관리되는 존재로서 살 수 밖에 없는 것일까? 푸코는 이에 대한 대답으로서 근본적으로 억압-해방의 가설에 입각해 있는 ‘욕망’ 개념의 폐기 및 ‘쾌락의 활용’이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가령, 하나의 실체로서의 성이 존재하며, 그것이 또 다른 하나의 실체로서의 권력과 조우하고, 그러한 만남을 통해 권력과 성이 다양한 모습을 보이며 서로 결합되거나 혹은 거부되는 것이라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성은 “권력이 육체 및 그것의 물질성, 힘, 에너지, 감각, 쾌락을 포착하는 가운데 권력이 구성하는 섹슈얼리티 장치 안에서도 가장 내적이고 가장 관념적이며 가장 사변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지배하는 섹슈얼리티 장치를 분석하고자 한다면, 그 지점은 이른바 ‘생물학적 혹은 자연적이고도 본래적인’ 성과 그것의 욕망이 아니라, 역사적 정치적으로 구성된 결과물로서의 육체와 그것의 쾌락을 분석해야 한다. 따라서 “섹슈얼리티 장치에 대한 반격의 거점은 ‘성-욕망’(le sexe-désir)이 아니라 육체와 쾌락(le corps e les plaisirs)이어야 한다.”
이미 1976년에 발간된 『앎의 의지』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문장 안에는 이미 8년 후인 1984년 『쾌락의 활용』의 테제들이 배태되어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쾌락의 활용』에서 푸코는 『앎의 의지』와 달리 진리의 정치적 역사(histoire politique de la vérité)를 전면에 내세우고, 이제 욕망인의 해석학, 욕망인의 분석학, 욕망인의 계보학에 집중한다. 푸코의 입장에서 ‘욕망’이란 단어는 정신분석에서 그 단어가 여전히 주요한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서 잘 보이는 것처럼 여전히 근본적으로 푸코가 비판하는 프로이트의 억압-해방 가설에 입각해 있는 것, ‘성-욕망’의 담론에 기초한 것이다. 자연적 생물학적 성과 욕망이 아니라, 사회적 역사적으로 구성되는 육체와 쾌락이 문제이다. 욕망이 아니라 쾌락이다. 쾌락은 주어진 한 사회와 시기에서 일정한 진리놀이들과 함께 개인이 스스로를 주체로 구성하는 주체화 과정의 주요 요소인 동시에, 자기의 테크놀로지를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푸코는 이를 다시 타인에 대한 지배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지배의 관념과 연결시키면서 통치성(gouvernementalité)의 문제와 연관시킨다. 통치성은 이후 푸코의 사유를 자기와 자기 자신의 관계(rapport de soi à soi)를 의미하는 ‘윤리’라는 새로운 영역에로 이끌게 되는 개념이다. “자기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지배할 수 없다.” 이것이 푸코의 지식의 영역, 권력의 영역을 잇는 제3의 영역 곧 윤리(l'éthique)의 영역이다. 쾌락의 활용(usage des plaisirs, chrēsis aphrodision)이란 고대 그리스 사상에서 보이는 개념으로서, 푸코는 이를 육체에 대한 관계, 아내에 대한 관계, 소년들에 대한 관계 및 진리에 대한 관계라는 네 가지 영역을 통해 분석한다. 이는 다시 고대 그리스어에서 ‘성적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였던 ta aphrodisia 개념에 대한 분석과 겹치면서 “아프로디지아가 어떻게 도덕적 배려의 영역으로서 구성되었는가?”를 탐구한다. 푸코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도덕적 체험의 변형들을 이해한다면, 성적 엄격함은 법전(code)의 역사보다 더욱 더 결정적인 하나의 역사, 곧 개인을 도덕적 행동의 주체로서 성립시키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 양식의 완성으로서 이해되는 윤리의 역사에 속한다.”
2013. 8. 30.
2013. 4. 14.
질 들뢰즈, <차이와 반복>
* 반복의 두 가지 형식
특수자의 일반성
|
독특한 것의 보편성
|
똑 같은 개념 아래 재현된
대상들 사이의 차이
|
이념에 상응하는 역동적 시공을 창조하는 어떤 순수한 운동으로 펼쳐지는 차이
|
일반적 개념과 특수한 것
사이의 추상적 관계(44)
le rapport abstrait du particulier
avec le concept en général(26)
|
이념 안에서 독특한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의 진정한 관계
le vrai rapport du singulier et de l'universal dans l'Idée
|
질적 유사성(=어긋나 있는 반복)
양적 등가성
|
교환불가능
대체불가능
|
동일성(재현=추상적인 거짓 운동)
|
반복(=실제적 운동)
|
이데아(원형)/모상
|
시뮬라크르
|
시간성/무시간성
역사성/영원성
특수/보편
|
시대에 반하는
도래할 시대를 위한
지금-여기(Erehwon)
|
추상적 보편자/경험적 특수자
|
분열된 자아를 위한 코기토
개체화들이 비인격적이고 독특성들이 전(前)-개체적인 세계,
눈부신 익명인 ‘아무개’(on)의 세계
|
이념의 외부로 추락하는 차이
개념 안의 같음의 형식 아래로 전락하는 차이
|
개념 없는 차이 = 반복
|
개념의 외부에
|
이념의 내부에
|
같음의 반복
|
자신 안에 차이를 포괄
|
개념이나 재현의 동일성에 의해 설명
|
이념의 타자성,
어떤 ‘간접적 현시’의 다질성 안에 포괄
|
개념의 결핍에서 성립하는 부정적 반복
|
이념의 과잉에서 성립하는 긍정적 반복
|
가언적
|
정언적
|
재현의 연극
|
반복의 연극
|
개념과 재현
|
힘과 운동
|
매개
|
매개 없는 직접성
|
추상적인 총체적 결과
작업의 결과
|
작용 중인 원인
몸짓의 ‘진화’
|
박자-반복
|
리듬-반복
|
산술적 리듬
|
강세적 리듬
|
평범한 단어들의 수평적 반복
|
단어들의 내면으로 다시 상승이 일어나는 수직적 반복, 특이점들의 반복
|
관념적 운동성
|
감각적 운동성
|
정태적
|
역동적
|
결과 안에서
|
원인 안에서
|
외연 안에서
|
강도적
|
평범
|
독특ㆍ특이
|
수평적
|
수직적
|
개봉되고 설명됨
|
봉인되어 있으며 해석되어야 함
|
특수자의 일반성
|
독특한 것의 보편성
|
공전(公轉)의 성격
|
진화의 성격
|
동등성ㆍ통약(通約)가능성ㆍ대칭성
|
비동등성ㆍ통약불가능성ㆍ비대칭성
|
물질적
|
(자연과 대지 안에서조차) 정신적
|
생기 없음
|
우리의 죽음과 삶들,
우리의 속박과 해방들,
악마적인 것과 신적인 것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음
|
* 차이와 반복
차이
|
반복
|
개념적 차이
|
개념 없는 차이
무한정 이어지는 개념적 차이에서 벗어나는 차이
|
내생적 차이들의 개념적 질서
|
외생적 차이들의 공간적 질서
|
발산과 탈중심화
|
전치와 위장
|
순수한 차이
|
복합적 반복
|
2013. 3. 20.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 안전, 영토, 인구
<생명관리 정치의 탄생> - 이 경이로운 책은 Foucault(ians)를 구원할 것인가, 서동진을 구원할 것인가
http://blog.aladin.co.kr/705625157/5916916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769099
<안전, 영토, 인구> - <감시와 처벌> 이후의 Foucault 정치학이 Deleuze에게 날리는 직격탄
http://blog.aladin.co.kr/705625157/5914507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769021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769099
<안전, 영토, 인구> - <감시와 처벌> 이후의 Foucault 정치학이 Deleuze에게 날리는 직격탄
http://blog.aladin.co.kr/705625157/5914507
http://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SBN=8994769021
2013. 3. 4.
일제시대 음악 1 - 홍난파, 현제명
* 홍난파

친일
* 봉선화 [1920/1925]
* 현제명

친일
* 희망의 나라로 [1931]
2010년 8월13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제3회 우남 이승만 애국상 시상식. (사)대한민국사랑회 주최.
* 대한민국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정리, 친일파 명단
전체
문화
朝鮮 - 唱歌, 演歌, 流行歌 [-1945]
k pop
The beginnings of Korean popular music
The history of Korean popular music can be traced back to 1885 when an American missionary, Henry Appenzeller started teaching American and British folk songs at a school. These songs were called changga in Korean, and they were typically based on a popular Western melody sung with Korean lyrics. The well-known song "Oh My Darling, Clementine" was for example known as "Simcheongga".[note 1] During the Japanese rule (1910–1945) popularity of changga songs rose as Koreans tried to express their feelings against Japanese oppression through music. One of the most popular songs was "Huimangga" (희망가, The Song of Hope). The Japanese confiscated the existing changga collections and published lyrics books of their own.[26]
The first known Korean pop album was "Yi Pungjin Sewol" (This Tumultuous Time) by Park Chae-seon and Lee Ryu-saek from 1925 and contained popular songs translated from Japanese. The first pop song written by a Korean composer is thought to be "Nakhwayusu" (낙화유수, Fallen Blossoms on Running Water) sung by Lee Jeong-suk in 1929.[26] In the mid-1920s, Japanese composer Masao Koga mixed traditional Korean music with Gospel music that American Evangelists introduced in the 1870s. This type of music became known as Enka in Japan, and later in Korea as Trot (Korean: "트로트").[27][28] These songs became extremely popular.[26]
Later, in the 21st century K-pop singers rediscovered the genre of trot, for example singers like Daesung from Big Bang and several members of Super Junior produced trot singles.[29][30]
* 唱歌 [쇼카]
* 박향림, 오빠는 풍각쟁이, 1938
* 남인수(1918-1962) 헌정 홈페이지
* 친일파 남인수
* 황성옛터 1932 [1959 tv appearance]
* 애수의 소야곡
- 이노홍(李蘆鴻) 작사 / 박시춘(朴是春) 작곡 / 1938
- 이노홍(李蘆鴻) 작사 / 박시춘(朴是春) 작곡 / 1938
* 감격시대, 1939
* 가거라 삼팔선
- 이부풍 작사(1947), 반야월 개사(1949) / 박시춘 작곡 / 1949
아 ~ 산이 막혀 못오시나요
아 ~ 물이 막혀 못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꿈마다 너를 찾아 꿈마다 너를 찾아
삼팔선을 탄한다
아 ~ 꽃필 때나 오시려느냐
아 ~ 눈올 때나 오시려느냐
보따리 등에 메고 넘든 고갯길
산새도 나와 함께 울고 넘었지
자유여 너를 위해 자유여 너를 위해
이 목숨을 바친다
아 ~ 어느 때냐 터지려느냐
아 ~ 어느 때나 없어지려느냐
삼팔선 세 글자를 누가 지어서
이다지 고개마다 눈물이든가
손모아 비나이다 손모아 비나이다
삼팔선아 가거라
* 현인, 신라의 달밤 [1947]
* 신라의 달밤 [1969, tv appearance]
2013. 2. 5.
환상의 사슬을 넘어서 - 마르크스, 프로이트와 나의 만남
erich fromm, 1900-1980
Beyond the Chains of Illusion: my encounter with Marx and Freud [1962]
"인간적인 것 중에 나와 무관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Homo sum, humani nihil a me alienum puto."(17)
"어떤 상황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싶다는 소망은 그러한 환상을 필요로 하는 상황 자체를 버리고 싶다는 소망이다(마르크스)."(20)
"정신분석을 받는 환자가 분석가를 사랑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또는 미워한다 해도, 그것은 모두 분석가의 현실적 인격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프로이트는 관찰하였다. 그래서 그는 환자가 어린아이였을 때 부모에 대해 체험한 사랑이나 두려움 또는 미움의 감정을 분석가에게 옮긴다(전이, 轉移)는 가정에 따라 이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믿었다."(55)
"사람이 무의식을 발견하는 일은 정확히 개념적 행위에만 머무르지 않는 하나의 감정적 체험이며 언어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 무의식적 체험이나 사고, 감정을 자각한다는 일은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바라본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호흡을 자각하는 일이 호흡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일이다. 무의식의 자각은 자발적으로 갑자기 일어나는 일로 특징지어지는 체험이다. 그 사람의 눈이 갑자기 열리고 자기와 세계가 다른 빛으로 비치며 다른 관점에서 보이게 된다. 이 체험이 일어나면 커다란 불안이 생기지만 이는 곧 사라지고 그에 이어 새로운 힘이 느껴진다. 무의식의 발견 과정은 항상 확대되는 일련의 체험으로 기술할 수 있는데, 이는 깊이 느껴지는 것이며 이론적 개념적 지식을 초월하는 것이다."(96)
"어떤 체험이 자각되기 위해서는 그 체험이 의식적 사고를 구성하는 범주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자기의 안팎에서 일어난 어떤 사건을 자각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이해 가능한 범주 체계와 관계와 있을 때뿐이다. [...]
더욱이 어떤 체험이 자각되는 것은 그것이 자각 체계나 그에 대한 범주로서 이해되고 관련되며 질서 속에 위치를 부여해주는 조건의 내부에 존재할 경우뿐이다. 더욱이 이 체계 자체가 사회적 진화의 산물이다. [...] 이 체계는 사회에 의해 조건지어진 필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나의 체험은 이 필터를 거치지 않으면 자각되지 않을 것이다.
[...]
마음에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체험이 자각되느냐의 여부는 그 체험이 그 문화에서 중요시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을 뿐이다. 감정적 체험 중에는 일정한 언어에서 그에 해당하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언어에서는 그 느낌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서로 다른 감정적 체험을 표현하지만 해당 단어를 갖지 않는 언어문화권에 속하는 사람이 그 체험을 명료히 자각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반적으로 한 언어가 그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갖고 있지 않은 체험을 거의 자각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적 합리적 도식에 들어맞지 않는 체험과 특히 관계가 깊은 말이다. [...] 우리의 언어에는 어떤 종류의 신체적 체험을 기술하는 말이 없는데, 그 까닭은 이러한 체험이 우리의 사고 도식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 언어 전체는 삶에 대한 태도를 포함한 것이어서 일정한 방식으로 체험되는 삶을 결정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자각을 가능케 하는 필터의 제2의 측면은 일정한 문화로 사람의 사고를 인도하는 논리이다. 자신들의 언어는 '자연'스러우며, 다른 언어는 같은 것을 그저 다른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고방식을 규정하는 법칙이 자연스럽고 보편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하나의 문화 체계에서 불합리한 것은 자연의 논리에 위배되므로 다른 문화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
[...]
언어와 논리는 일정한 체험을 자각하는 일을 어렵게 하고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적 필터의 일부분인데, 이 필터에는 가장 중요한 제3의 역할이 있다. 이 역할은 어떤 종류의 감정이 의식에 도달하는 것을 허용치 않으며, 설령 도달하더라도 의식 영역으로부터 배제해 버리는 경향을 갖는다. 이 필터는 사회적 터부에 의해 형성되는데, 일정한 관념이나 감정을 부당하고 금지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들이 의식 수준에 도달하는 것을 방지하려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원시 종족의 예를 들어 보는 게 좋으리라 생각한다. 이를테면 먼저 다른 종족을 죽이거나 강탈함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종족의 어느 누군가는 죽이거나 약탈하는 일에 충격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사람이 다른 모든 종족원의 생각과 따를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도 없는 이런 감정이 자신에게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회적으로 모순되는 감정을 자각하면 그는 완전히 고립되고 추방될 위험성이 있다. 그 때문에 이러한 정신적 충격을 체험한 사람은 이 감정을 자각하는 대신 구토 등의 다른 신체적 증상을 나타낼 것이다. 또 평화로운 농경 종족의 일원이 도망하여 다른 종족을 죽이고 약탈하고 싶은 충동을 갖는다라는 전혀 반대되는 경우에도, 이 충동은 아마도 자각되지 않은 채 대신 그에게 격렬한 공포 등과 같은 증상을 낳을 것이다.
* 원주 17) [...] 사회적 무의식의 개념은 사회적 억압이라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일정한 사회가 자각을 허용하지 않는 인간 체험의 특수한 부분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무의식은 그 사회가 인간으로부터 멀리 하려 한 인간성의 일부이며, 보편적 마음속에서 사회적으로 억압된 부분이다."(114-121)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 학교, 교회, 영화, 텔레비전, 신문 등으로부터 이 모든 이데올로기를 주입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고 관찰한 것처럼 생각해 버린다. 이러한 과정이 우리와 적대되는 사회에서 행해지면 그것을 '세뇌', 혹은 보다 완화된 표현으로 '교화' 혹은 '프로파간다'라 부르며, 우리의 사회가 동일한 일을 행할 경우 그것을 '교육' 혹은 '보도'라 부른다."(124)
"인간은 단순히 한 사회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류 사회의 일원이기도 하다. [...] 자기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능력은 그 사람이 어느 만큼 자신이 속한 사회의 한계를 넘어 세계 시민이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126-127)
"일반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형에 맞지 않는 사고나 감정을 자각할 수 없으며, 그 때문에 이를 억압하게 된다. 형식적으로 말하면, 무엇이 무의식이 되고 무엇이 의식이 되는가는 사회 구조와 그것이 낳는 감정과 사고의 패턴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무의식의 내용에 대한 법칙은 없다. 그러나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의식의 내용은 선악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가진 인간의 전부를 항상 대표하며 주어진 문제의 온갖 해답의 바탕이 된다는 점이다. 동물적 존재로 되돌아간 듯한 가장 퇴화된 문화의 경우를 생각해보면, 동물적 욕망은 우세해져 의식화되지만 이 수준을 넘어서는 모든 노력은 억압된다. 퇴화한 데서부터 정신적이고 진보적인 목표에 도달한 문화에서 암흑의 힘은 무의식이 된다.
그러나 어느 문화에서든 인간은 자신 속에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인간은 원초적 인간이고 맹수이며 식인종이고 우상숭배자인 동시에 이성과 사랑과 정의를 가진 존재이다. 그러므로 무의식은 선한 것도 악한 것도, 합리적인 것도 비합리적인 것도 아니며, 양자를 모두 겸한 것이자, 이들 모두는 다 같이 인간적인 것이다. 무의식은 인간 전체로부터 그 사회에 적합한 부분을 제거한 것이다. 의식은 사회적 인간, 즉 개인이 우연히 내던져져 있는 역사적 조건에 의한 제한 속에 있다. 무의식은 우주 속에 나타난 보편적 인간 곧 인간 전체를 나타내며, 인간 속에 있는 식물, 동물, 정신을 나타내고, 인간의 과거 곧 인간적 존재의 새벽을 나타내는 것이자, 더욱이 인간이 충분한 인간성을 획득하여 자연이 '인간적으로' 되고 인간이 '자연과의 조화를 다시금 획득하게 될' 날에 이르는 인간의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무의식을 자각하는 일은 완전한 인간성을 획득하는 동시에 사회가 인간 사이에 구축했기 때문에 생겨난 인간과 그 동포들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목표를 완전히 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거의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일이다. 더욱이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사회적 조건 때문에 생겨난 자기 자신과 인류로부터의 소외 상태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이다."(127-128)
"과거 2,000년 동안 서양사를 특징지어온 것은 희망의 원리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161)
***
"나는 믿는다 - 인생이나 역사에는 개인의 인생에 의미를 부여해주고 그 고통을 정당화해줄 만한 어떤 궁극적 의미도 없다. [...] 어떤 신학적 철학적 역사적 의상을 걸친 신이라 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거나 심판할 수 없다. 단지 인간만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발견할 수 있다."(172-173)
"나는 믿는다 - 설령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대신 결단을 내려준다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구원해줄 수는 없다. 사람이 타인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진실과 애정으로 감사이나 환상에 빠지는 일 없이 그의 앞에 양자택일을 제시해주는 일일 뿐이다. 진정한 양자택일에 직면하면 그 사람의 모든 숨은 에너지가 깨어나며 그 사람은 죽음에 반항하여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삶을 선택할 수 없을 때, 타인이 그에게 삶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려 한다 해도, 그것은 다만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173)
"나는 믿는다 - 인간성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 있다. 우리는 지능, 건강, 재능 등의 면에서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이다. 우리는 모두 성자이고 죄인이며, 어른이자 어린아이이기도 하지만, 어느 누구도 다른 이들보다 우월한 자이거나 심판자일 수 없다. 우리는 모두 부처와 함께 깨달은 자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자이고, 칭기즈칸이나 스탈린, 히틀러와 함께 살육하고 약탈한 것이다."(175)
"나는 믿는다 - 이성도 인간이 희망과 신념을 갖지 않을 때는 무력하다. 괴테가 말한 것처럼 역사상 여러 시기의 가장 큰 차이는 신념과 불신의 차이이다. 신념이 지배하던 모든 시대는 눈부시게 고양되고 풍요했던 것에 비해, 불신이 지배한 시대는 퇴색해 있는데, 그 이유는 공허한 것에 자기를 바칠 인간은 없기 때문이다. 의심할 것도 없이 르네상스와 계몽주의의 19세기는 신념과 희망의 시대였다. 그러나 20세기의 서양 세계는 희망과 신념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닐까? 사실 인간에 대한 신념이 없으면 기계에 대한 신앙이 우리를 파멸로부터 구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이 '신앙'이 '종말'을 재촉하게 될 뿐이리라. 그러므로 서양 세계가 생산이나 산업이 아니라 인간성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휴머니즘의 부흥을 이룩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심 문제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위대한 문명처럼 '서양' 역시 소멸될 것이다."(176-177)
"나는 믿는다 - 서양 자본주의 및 소련과 중공의 공산주의는 모두 미래를 해결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관료주의를 만들어내고 인간을 물건으로 전환시켰다. 인간은 자연이나 사회의 힘을 자기의 의식과 합리적 통제 밑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그것은 물건과 인간을 관리하는 관료주의의 통제가 아니라, 만물의 척도로서의 인간을 위해 물건을 관리하고 복종시키고 자유롭고 협동적인 생산자에 의한 통제이어야 한다. 양자택일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료주의'와 '휴머니즘' 사이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인간이 갖는 모든 힘윽 개화시키는 일이 최종적 목표가 되는데, 이에 필요한 조건을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은ㅇ 민주적이고 지방분권적인 사회주의 밖에 없다."(177-178)
피드 구독하기:
글 (At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