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그랬고 늘 그럴 수밖에 없지만,
한 시대의 새로운 세대는 그 이전의 시대를 알 수가 없다.
역사란 찾아서 공부할 필요가 있는 그 무엇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 사이트는 참으로 유용한 우리 시대의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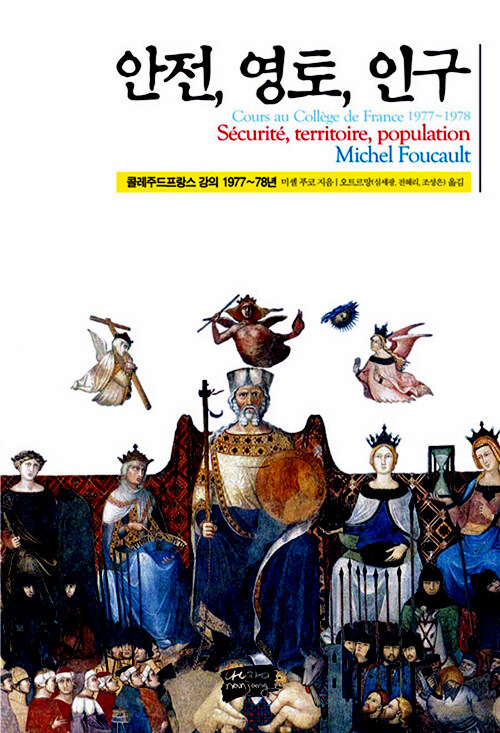
Original French
|
English Translation
|
국역
| |
1942
|
La Structure du comportement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42)
|
The Structure of Behavior, trans. Alden Fisher, (Boston: Beacon Press, 1963; London: Methuen, 1965).
|
『행동의 구조』
김웅권 옮김
동문선
2008
|
1945
|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Gallimard, 1945)
|
Phenomenology of Perception, trans. Colin Smith (New York: Humanities Press, and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trans. revised by Forrest Williams (1981; reprinted, 2002);
new trans. Donald A. Landes (New York: Routledge, 2012).
|
『지각의 현상학』
류의근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2
|
1947
|
Humanisme et terreur, essai sur le problème communiste
(Paris: Gallimard, 1947)
|
Humanism and Terror: An Essay on the Communist Problem trans. John O'Neill, (Boston: Beacon Press, 1969)
|
『휴머니즘과 폭력. 공산주의 문제에 대한 에세이』
박현모ㆍ유영산ㆍ이병택 옮김, 문학과지성사
2004
|
1948
|
Sens et non-sens (Paris: Nagel, 1948, 1966)
|
Sense and Non-Sense trans. Hubert and Patricia Allen Dreyfus,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64).
|
『의미와 무의미』
권혁면 옮김
서광사
1990
|
1949
-
1950
|
Conscience et l'acquisition du langage (Paris: Bulletin de psychologie, 236, vol. XVIII, 3–6, Nov. 1964)
|
Consciousness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trans. Hugh J. Silverman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73).
|
-
|
1949
-
1952
|
Merleau-Ponty à la Sorbonne: résumé de cours, 1949-1952
(Grenoble: Cynara, 1988)
|
Child Psychology and Pedagogy: The Sorbonne Lectures 1949-1952, trans. Talia Welsh (Evanston, Ill.: Northwestern Univ. Pr., 2010)
|
-
|
1951
|
Les Relations avec autrui chez l’enfant
(Paris: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1951, 1975)
|
The Child’s Relations with Others, trans. William Cobb, in The Primacy of Perception ed. James Edie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64), 96-155.
|
-
|
1953
|
Éloge de la Philosophie, Lecon inaugurale faite au Collége de France, Le jeudi 15 janvier 1953
(Paris: Gallimard, 1953)
|
In Praise of Philosophy trans. John Wild and James M. Edie,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63)
|
-
|
1955
|
Les aventures de la dialectique
(Paris: Gallimard, 1955)
|
Adventures of the Dialectic trans. by Joseph Bien,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73; London: Heinemann, 1974)
|
-
|
1958
|
Les Sciences de l’homme et la phénoménologie
(Paris: Centre de Documentation Universitaire, 1958, 1975)
|
Phenomenology and the Sciences of Man, trans. by John Wild in The Primacy of Perception ed. by James Edie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64), 43–95.
|
-
|
1960
|
Éloge de la Philosophie et autres essais (Paris: Gallimard, 1960)
|
-
|
-
|
1960
|
Signes
(Paris: Gallimard, 1960)
|
Signs trans. Richard McCleary,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64).
|
[부분번역]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김화자 옮김
책세상, 2005
|
1961
|
L’Œil et l’esprit
(Paris: Gallimard, 1961)
|
Eye and Mind trans. by Carleton Dallery in The Primacy of Perception ed. by James Edie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64), 159-190. Revised translation by Michael Smith in The Merleau-Ponty Aesthetics Reader
(1993), 121-149.
|
『눈과 마음. 메를로-퐁티의 회화론』
김정아 옮김
마음산책
2008
|
1964
|
Le Visible et l’invisible, suivi de notes de travail
Edited by Claude Lefort
(Paris: Gallimard, 1964)
|
The Visible and the Invisible, Followed by Working Notes, trans. Alphonso Lingis,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68).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남수인ㆍ최의영 옮김
동문선
2004
|
1968
|
Résumés de cours, Collège de France 1952-1960
(Paris: Gallimard, 1968)
|
Themes from the Lectures at the Collège de France, 1952-1960
trans. John O’Neill,
(Evanston: Northwestern Univ. Pr., 1970).
|
-
|
1969
|
La Prose du monde
(Paris: Gallimard, 1969)
|
The Prose of the World, trans. John O’Neill, Evanston:
Northwestern University Pr., 1973; London: Heinemann, 1974
|
-
|
-
|
-
|
-
|
[국내 편역본]
『현상학과 예술』
오병남 옮김
서광사, 19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