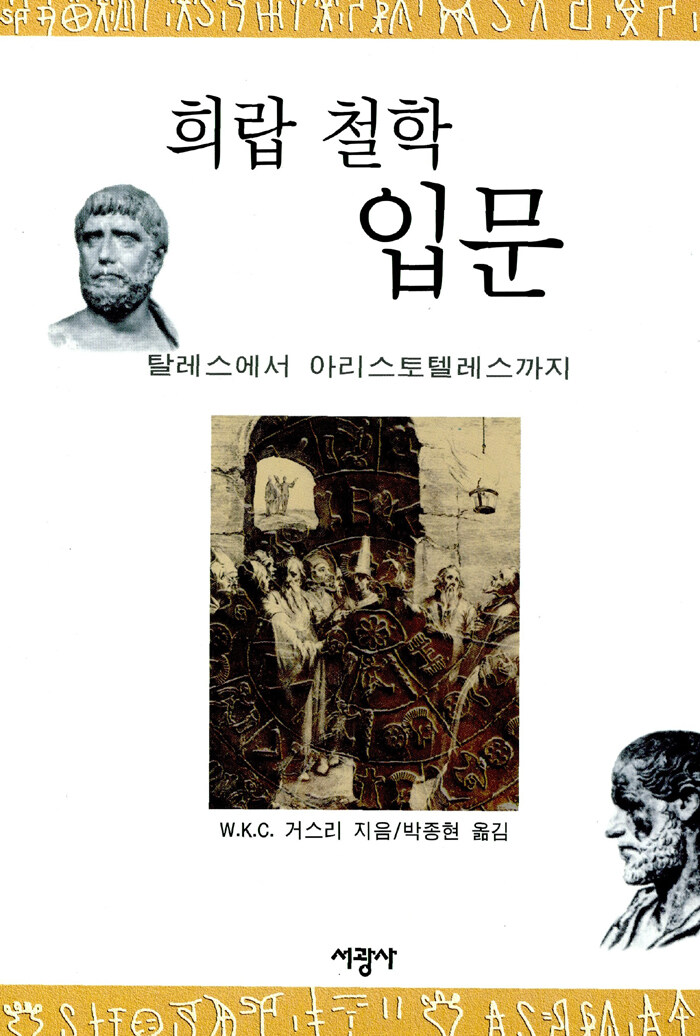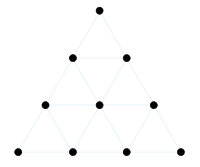"이해한다는 것, 그리고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말로 - 음성을 통해서건, 혹은 쓰여진 문자를 통해서건 - 무언가를 표현할 때, 우리는 이 표현이 이해되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해되어져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출발한다. 가다머에 의하면 표현이란 무엇보다도 ‘누군가를 위한 표현(Darstellung für jemanden)’(GW, I. 114)이며, 그런 한에서 모든 표현은 - 그것이 표현인 한 - 이해되어지기를 의욕한다(vgl. GW. I, 480, 485, u. II, 76). 그러므로 모든 해석학적 현상의 배후에는 개별성 간에 ‘서로를 이해하려는 좋은 의지(gute Wille, einander zu verstehen)’가 자리잡고 있다. [...] 반면 이해되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표현도 있고, 통일성 속으로 소멸되기를 거부하는 개별성도 있다. 언젠가 니체는 “이해되어진다는 것은 매우 모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 니체에게 있어서 이해의 위기는 니체라는 이름의 천재적인 개별성이 운명적으로 겪어야 하는 정신적 고독을 의미한다. 천재 내지 초인의 삶을 특징짓는 것은 ‘이해와 동일에로의 - 형이상학적으로 좋은 - 의지’가 아니라, ‘힘에의 의지’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언젠가 브레히트가 인상적으로 표현했듯이 ‘홀로 걷는 자의 위험’(Gefahr der Einzelganger)이다. 이 위험을 니체는 긍정하고 즐긴다. 왜냐하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즉 통일되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에 니체라는 개별성의 ‘권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해로의 좋은 의지(guter Wille zum Verstehen)와 이해되지 않으려는 의지(Wille zum Nichtverstandenwerden)가 교차하는 곳, 전체성에로의 ‘귀속Zuordung’(GW. I, 462)과 이 귀속을 거부하는 개별서이 충돌하는 곳 - 바로 여기서 철학적 해석학과 해체주의 간의 논쟁이 시작된다."
- 김창래, 「통일과 해체의 이율배반 - 하이데거의 니체 해석에 대한 이른바 있을 법하지 않은 논쟁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철학연구』 vol. 24 no. 1, 2001, 66-68쪽.